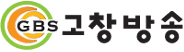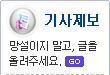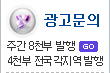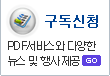|
|

|
|
동방 5현 일두 정여창 모신 남계서원
|
|
초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서원으로 다른 서원들의 표본
|
|
2020년 07월 08일(수) 11:41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기획 >> ③ 남계서원(濫溪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동방 5현 일두 정여창 모신 남계서원
초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서원으로 다른 서원들의 표본
작고 아담하지만 절제된 형식으로 준엄함을 갖춘 남계서원은 외유내강의 선비정신을 느끼게 한다.
남계서원이 위치한 함양 땅은 예로부터 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고장이었다.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이 그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한양에서 볼 때 낙동강 왼쪽에 위치한 안동과 오른쪽에 위치한 함양이라는 의미인데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학문과 문벌에서 으뜸이라는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다. 안동이 퇴계 이황을 내세운다면 함양에서는 단연 남계서원에 모신 일두 정여창을 내세운다.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훌륭한 유학자를 모시는 동국 18현이면서, 조선시대의 뛰어난 유학자를 모시는 동방 5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는 백욱(伯?), 호는 일두(一?) 혹은 수옹(睡翁),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한 마리의 좀벌레’에 자신을 비유한 ‘일두’, ‘조는 늙은이’로 묘사한 ‘수옹’이라는 호에서 시류에 동요하지 않고자 하는 곧고 강직한 의지와 겸손한 성품을 느낄 수 있다. 본관은 경남 하동이나 증조 때 증조모의 고향인 함양으로 옮겨와 함양사람이 되었다. 어릴 때 이름이 백욱(佰勖)이었는데,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온 중국의 사신, 장영(張寧)이 그를 눈여겨보고 ‘집을 크게 번창 하게 할 인물‘이라는 의미로 여창(汝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의 문하에서 김굉필과 같이 공부하였고 성종 21년(1490)에 관직에 나가 연산군의 스승이 되었다. 연산군 1년(1495)에 안음현감에 임명되어 명관(明官)으로 칭송 받았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다. 연산군 10년(1504)에 54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같은 해 갑자사화로 부관참시 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복관되어 중종 12년(1517)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광해군 2년(1610)에 문묘에 승무(陞?)되었다.
함양 남계서원은 사적 제4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서원으로서 영주 소수서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유서 깊은 서원이다. 북한에 위치한 서원까지 따져보면, 명종 4년(1549)에 건립되었던 문헌서원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한다.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건물 배치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과 달리 남계서원은 이후 서원의 표본이 되었다.
다른 서원에 비해 건축공간의 규모는 작으나 공부하는 공간을 앞 쪽에 배치하고 제향 공간을 뒤 쪽에 배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비롯하여 앞은 낮게 하고 뒤를 높게 건축한 전저후고(前低後高)의 배치 등이 우리나라 서원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남계서원 이전에 세워진 국학 성균관이나 향교가 사당을 앞에 배치한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형태인 것과 달리 남계서원의 전학후묘의 형식은 강학공간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변화를 주어 다른 서원의 본보기가 되었다.
남계서원은 완만한 경사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양택(陽宅)입지의 중요한 요건인 전저후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사당을 가장 높은 곳에 둔 점은 단순히 지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자가례』의 사당배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남계서원은 『주자가례』의 예제(禮制)에 따라 서원 건축의 규정성을 갖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로서 건축사적 의의를 지닌다.
명종 7년(1552)에 개암 강익 선생 주도로 유림과 주민들이 일두 정여창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어져 공사를 재개한지 7년 만인 1559년에 완성하였다. 1561년 모든 시설을 갖추어 정여창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강익이 39세의 나이로 초대 원장이 되었다. 명종 21년(1566)에 서원 근처 시내의 이름을 딴 ‘남계(?溪)’로 사액서원이 되었다.
서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유생의 숫자는 서원이 사액서원인지, 배향된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졌다. 일반 서원은 15명 정도 교육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사액서원은 20명, 사액서원이면서 문묘에 종사된 인물을 배향하고 있으면 30명의 유생을 교육할 수 있었다고 하니 남계서원은 30여 명의 유생들을 교육하던 위세 높은 서원이었다.
전쟁은 인간에게나 문화재에게나 위협적인 것이어서 임진왜란을 무사히 넘긴 남계서원은 전쟁의 비극을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으로 불에 타 소실되었다. 선조 36년(1603)에 나촌(羅村)에 이축하였다가 광해군 4년(1612)에 옛터에 재건하였다.
숙종 때 서원 건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초대 원장을 지냈던 개암 강익과 동계 정온을 추가 배향하였다. 동계 정온은 개암의 외조카로, 인조 14년(1636)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던 해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서 적들과 맞서며 강력한 척화를 주장하였다. 결국 강화도가 함락되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가 항복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칼로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관직을 버리고 인적이 드문 모리에 은거하다가 1641년 세상을 떠났다.
사당 오른쪽 담장 밖 별사에는 뇌계 유호인과 정여창의 현손인 송탄 정홍서를 배향하였으나 서원 훼철로 인하여 별사는 철폐되었다.
산 높고 골 깊은 함양 땅이지만 서원 앞으로 너른 들에는 농부들의 양파 수확이 한창이었다. 2차선 도로 옆 서원의 주차장에 차를 쉬게 하고 오른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신성하게 여겨지는 공간 앞이면 반드시 세워져 있는 하마비와 홍살문이 보인다. 홍살문은 원래 화살 전(箭)자를 쓰는 홍전문이었다. 예로부터 태양의 색인 붉은 색은 사악한 기운은 내쫓는 색으로 여겨졌다. 홍살은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가 있고 홍살문의 한 가운데 삼지창은 액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향교, 서원, 능, 열녀, 효자 등을 배출한 집안이나 마을 등 신성시되는 장소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조선시대 유교의 출입문이다.
홍살문을 지나면 2층 누각의 형태를 갖춘 풍영루(風詠樓)가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펼치고 방문객을 맞는다. 원래는 ‘도를 좇다’라는 의미의 준도문(遵道門) 현판이 걸린 출입 삼문이었으나 후에 누각으로 증수하면서 풍영루라는 현판을 달았다. 풍영루 현판이 앞에 걸려있고 준도문 현판은 뒤를 장식하고 있어서 이 건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풍영루는 출입문을 1층에 두고 2층은 강학 공간인 명성당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풍영루를 지나 들어서면 독특하게도 양 옆으로 두 개의 사각형 연지(蓮池)가 있고, 묘정비각이 서재 쪽으로 치우쳐 앞에 배치되어 있다. 서원이 세워지고 200여 년간 묘정비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정조 3년(1779)에 봉사손(奉祀孫)인 정덕제에 의해 세워졌는데, 비문에는 남계서원을 세운 과정과 세 선생을 배향한 시기, 세 선생의 행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김종후가 비문을 짓고, 황운조가 글씨를 썼으며, 홍낙명이 전서체로 비의 명칭을 썼다.
명성당 앞으로는 유생들의 생활공간인 동재, 양정재(養正齋)와 서재, 보인재(輔仁齎)가 있다. 양정재는 ‘교육으로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라는 역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이고 보인재는 ‘군자는 글로서 벗을 사귀고 벗으로 인을 돕는다’는 논어의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동서재는 모두 2칸 규모의 건물로 1칸에는 온돌방을 들이고 1칸은 누마루로 만들어 연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지는 동재와 서재 앞 쪽에 각각 놓았다. 일두는 송나라 성리학자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영향을 받아 매화와 연꽃을 사랑하여 동재의 누마루를 애련헌이라 하고 서재의 누마루를 영매헌이라 이름 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서원 건립의 중요한 요소였던 장수유식(藏修遊息)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서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장수유식은 학문을 전심으로 닦아, 쉴 때에도 학문을 항상 마음에 둔다는 의미로 학문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며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적(全人的) 인격을 함양하고자 했던 뜻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 교실에 해당하는 중심 건물 명성당(明誠堂)은 ‘참된 것을 밝히는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되게 된다’는 중용의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1559년에 완성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양쪽으로 한 칸은 온돌 협실이 있다. 독특하게도 ‘남계’,‘서원’이라는 편액을 둘로 나뉘어 양쪽에 달았고 협실 위에도 학급의 명패를 부착하듯 거경재(居敬齋)와 집의재(集義齋)라는 편액을 달았다. 내부로 올라가 보면 천장에 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다. 그 중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은 내부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그 옛날 서원의 비밀금고처럼 사용된 듯하다.
명성당 동쪽 옆, 동재 뒤쪽으로 경판고가 위치해 있다. 경판고에는 유생들을 교육한 어정오경(御定五經) 등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 중이라 한다.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건물을 지면에서 띄워 4면을 모두 터놓았다. 이는 공기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여 판각을 잘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 벽체는 나무로 구성한 판벽으로 되어 있고 내부 역시 가운데 판벽이 있다.
명성당 서쪽 옆으로는 성생단이라는 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사에 올릴 제물을 위에 올려서 검수하는 곳이다.
명성당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37여 단의 계단을 오르면 내삼문을 두고 담장으로 구획을 이룬 사당 공간이 있다. 초기에 만들어진 서원이라 독특한 점이 많은데 사당에 현판이 없는 점도 그 중 하나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으로 이루어진 맞배지붕 건물로 주벽은 동방 5현의 한 분인 일두 정여창 선생을 모셨고 서쪽은 숙종 1년(1675)에 동계 정온 선생, 동쪽은 숙종 15년(1689)에 개암 강익 선생을 모셨다. 사당 영역의 동쪽 모서리에는 향사에 필요한 제기를 보관하고 제향을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이 있다.
남계서원은 전통을 전수하고 현대와 조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1박 2일의 역사문화 서원체험 프로그램인 ‘함양 구곡동천길’, 당일형인 ‘일두 백세청풍길’ 외에도 다례, 음악, 활쏘기, 서예를 체험할 수 있는 ‘남계서원 4예 체험’ 프로그램과 함양선비의 인문정신이라는 인문학 강좌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
|
|
고창신문 기자  .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