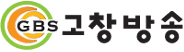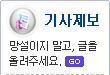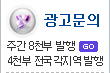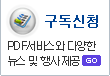|
|

|
|
최면암의 병오의병과 고창의 항일의사
|
|
2020년 06월 09일(화) 14:28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어쩌면 면암은 거의(擧義)를 천하에 알린 것으로서 이미 충군애국의 진정을 충분히 밝혔고, 조정의 유신(遺臣)으로서의 도리를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스승 면암의 충의를 흠모 추앙하며 의기(義氣)를 앞세워 기꺼이 동참했던 유생들은, 따로이 수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변변한 병기조차 지니지 않아 맨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으므로, 무장한 관군의 총칼 앞에 내세워 희생시킴은 면암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이때에 끝까지 면암을 따르겠다는 의사들만 남게 되자, 죽은 뒤에 식별하여 장례지낼 수 있도록 성명을 써서 벽에 붙이고 각각 그 아래에 의관을 갖추어 정좌해서 총탄을 맞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유생들은 행전을 풀고 뭉쳐 묶었던 넓은 바짓가랑이와 도포 소매를 꺼내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며, 갓끈을 바로 매고서 공수한 채로 벽을 기대고 꼿꼿이 앉았다.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맹자의 호연장(浩然章)과 웅어장(熊魚章)을 차례대로 낭송하였다. 하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북돋고, 또 하나는 의로움 앞에서 생명도 기꺼이 바친다는 사생취의(捨生取義)의 뜻을 가진 문장이므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에 써 붙인 명단은 면암 외에 임병찬, 고석진, 김기술, 문달환, 임현주, 유종규, 조우식, 조영선, 최제학, 나기덕, 이용진, 유해용 등 12인이었다. 이 중 다음날에 유종규 의사는 정시해 의사의 출상의 일로 밖에 나가고, 정탐으로 나가 있던 양재해 의사가 소식을 듣고 되돌아와 그 자리를 채웠다. 당시에 흥덕의 선비 고제만은 정탐으로 나갔고, 고용진은 친상으로 참여치 못했다.
7. 의병주모자 압송과 면암의 대마도 유배(流配)
관군과 대치한 지 5일째 되는 4월 23일에 전주진위대의 소대장이 황제의 칙서를 보이고, 곧 면암에게 다가가 허리에 찬 칼과 주머니를 풀어냈다. 말하자면 무장해제를 한 것이다. 이어서 왜군 10여명이 진위대 군사와 함께 면암과 임병찬 군수는 가마에 태우고, 나머지 11인은 결박시킨 채 도보로 상경길에 올랐다. 군사들은 일행을 세 겹으로 에워싼 채 호송하였는데, 길가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이 비분강개하고, 또 어떤 이는 뛰어들어 면암 앞에서 통곡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어떤 경우는 왜병이 심하게 구타하며 붙들어가 전주감옥에 구금시키기도 하였다. 이때 소식을 들은 성송의 최전구 선비는 공주 부근 진잠의 길가에서 면암을 뵙고, 일행을 따라 상경하였다.
순창을 떠난 일행은 나흘째인 28일 정오쯤에 대전에 도착, 기차에 올라 저물녘에 숭례문 밖에 도착하였다. 왜군 헌병대는 면암을 인력거에 태우고 나머지 12인은 도보로 따르게 하여 헌병사령부 감방에 구금하였다.
이곳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으나 의병들은 한결같이 이미 상소문과 일본정부에 보낸 문서에 밝힌 것이 전부임을 말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왜병들은 의사들의 충의에 경복하였다.
당시에 왜군은 의사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으므로 시일을 끌다가 6월 25일에야 저들의 헌병사령부에 불러 선고하였다. 면암은 3년, 임군수는 2년을 대마도 유배에 처하고, 고석진․최제학은 4개월 헌병부 구치소에 구금하며 나머지 9인은 곤장 일백대에 방송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7월 8일 새벽 남문 밖 정거장에서 자질 및 문생 수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면암과 임군수는 왜헌병의 보호아래 기차에 올랐는데, 면암의 자질들과 최전구 선비가 배행하였다.
이 날 저문 때에 동래 초량에 도착, 곧바로 배에 승선하여, 다음날 새벽에 대마도 엄원에서 하선하였다. 이어 그 곳 위수영 경비대 내에 구금되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난 달 6월 19일에 도착한 홍주의병 9인이 구금되어 있었다. 조선의 의사 11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본래 잠업교사의 주택이었는데 이때 경비대에서 임시관사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8. 대마도 유배 생활과 면암의 순국(殉國)
처음 면암과 임군수가 도착한 다음에 이곳 경비대와 의사일행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 그것은 경비대장이 위압을 행사하여 의병들을 굴복시키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경비대장은 병정 4~5명을 대동하고 찾아와 자신에게 예를 갖출 것을 명하였는데, 곧 갓을 벗도록 지시하였다. 의사들이 응하지 않자 그는 말하기를 “공들이 일본의 밥을 먹고 있으니 마땅히 일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갓을 벗으라면 벗고, 머리털을 깎으라고 하면 머리털을 깎아서 오직 명령을 따를 일이지 어찌 감히 거역하느냐(公等 食日本之食 當從日本之令 令脫冠則脫冠 令剃髮則剃髮 惟令是從 焉敢拒逆 : 前揭書 附錄 卷四, 二十)”하며 군사를 동원하여 강제로 갓을 벗기려하였다. 이때 면암이 큰 소리로 꾸짖자 칼을 빼어 위협하였다. 이에 면암은 도리어 가슴을 풀어 젖히며 속히 죽이라고 호통 치자 왜병도 그만 물러섰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면암은 일본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먹으며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단식을 통해 절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임군수에게 지필묵을 준비시켜 고종황제에게 올리는 마지막 상소문을 구술하고, 단식에 돌입하였다. 이때 좌우의 의사들이 적극 식사를 권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면암이 단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비대는 대장과 그 상관인 주둔군 대장까지 찾아와 면암을 위로하며, 전날 단발 운운한 것은 재일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인 사례를 말한 것으로서, 의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며, 또 이곳의 식비는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극구 변명함으로써 면암의 단식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의사들은 비록 구금되어 있는 처지였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본국과의 우편 내왕이 잦고, 또 문자제들이 방문하며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되었으므로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 오히려 의사들을 가까이서 접하는 왜인들, 예컨대 경비병, 숙소관리자, 통역, 경비대 장교들은 의사들의 숭고한 절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들의 글을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사실 면암을 비롯한 12인의 의사들은 모두 이름 있는 선비들이었다. 글을 읽고 쓰며 낭송하는 일이 일과였고 생활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상이 되었으며, 또 10월 16일에는 신축된 건물에 이거하는 등 그런대로 평온한 환경이 제공되었다.
일본 경비대장의 사과를 받은 면암과 일행은 단식을 중단하였고, 이곳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형편이었는데, 면암은 적소생활 100여일쯤 되는 10월 19일에 처음으로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이다가 점차 심해져 갔는데 적소인 만큼 알맞은 우리 약재를 구할 수 없었다. 이때 왜병 대장이 군의관을 보내어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대대장 이하 장교들이 매일 찾아와 위문하고, 우유를 매일 한 병씩 제공하였다.
면암의 병환이 차도가 없고 위중해지자, 11월 5일에 문인인 고석진 의사와 성내출신 노병희(魯怲喜, 1850~1918) 의관(醫官) 등이 본국에서 급히 적소에 도착하였다. 노의관은 일찍이 면암의 문인이 되었고, 한말 궁중의 태의원(太醫院) 겸전의(兼典醫)로서 명의(名醫)의 이름이 있었다. 갑진년(1904) 사직하고 향리 흥덕현 성내로 귀향하여 은거 하던 중 병오의거에 참여하였었다.
이때 노의관은 고석진 의사를 부산에 보내어 약재를 구하게 하고, 그로써 면암에게 해어탕(解語湯)과 소속명탕(小續命湯)을 처방 하였던바 잠시 정신이 깨어나기도 하였다. (위의 두가지 처방은 대체로 중풍(中風)에 처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암은 발병 한 달쯤 되는 11월 17일에 운명케 된다. 이때 노의관이 호상을 맡아 초혼하고, 바다를 건너 11월 21일 초량진에 영구를 안치할 때에 고석진, 최전구 의사들이 달려와 집례하였다. 춘추대의 일월고충(春秋大義 日月高忠)이라 쓴 높다란 만기를 필두로 수많은 만장이 뒤따르는 영거(靈車)가 지나는 연도나 멈추는 곳에는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남녀노소 수많은 신민(臣民)이 선생을 부르며 통곡하였다.
영거는 구포-김해-창원-칠원-창녕-현풍-성주-개녕-금산-황간-영동-옥천-회덕-공주를 거쳐 15일 만인 12월 7일에 정산 본가에 운구되고, 이듬해 정미년(1907) 4월1일에 노성에 예장되었다.
9. 고창의사(高敞義士)들의 후속 항일투쟁
병오년 태인 거의에 참여한 고창의 선비들인 고석진, 고제만, 고예진, 정시해, 최전구, 노병희, 고용진, 고순진, 강종해, 황종관 등은 모두 면암의 문인들이다. 이중 고석진, 최전구, 노병희 의사 등은 멀리 포천에 은거하던 면암을 찾아 집지한 것이 확인된다. 그 밖에 젊은 층은 면암이 충청도 정산에 이주(경자년, 1900)한 뒤 사제의 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호남의 선비들이 불원천리하고 먼 곳의 면암을 찾아 문인이 되고, 뒤에는 의진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아래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마을 훈장이 면암 최선생의 상소문 초본 몇 장을 여려 학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부군(최전구:필자주)이 이에 직접 한통을 베껴서 공부하는 틈틈이 읽고 외웠다. (내용은) 군주에 충성하고 부모를 친애할 것,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내칠 것, 정도를 지키고 사특함을 물리칠 것, 인륜을 바르게 세우고 예의를 높일 것, 배움에 힘쓰고 국가를 지킬 것과 백성을 보호할 것 등의 계책 아님이 없었다. 이로부터 선생을 태산북두처럼 우러러 보았다.
(一日塾師 以勉庵崔先生 疏章數本 示衆學徒曰 爲學者 不可不覽也 府君乃手謄一通 誦讀於課暇 無非忠君愛親 尊華攘夷 衛正斥邪 正人倫 尙禮儀 務學問 存國家 保全 生民之策也 自是仰先生 如泰山北斗: 崔銓九, 家狀)
위에서 보듯이 면암의 충군애국의 혁혁한 행적과 절의정신은 당대 젊은 선비들의 심중(心中)을 송동(竦動) 시켰던바, 이러한 사례는 호서(湖西)지역의 서당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에 호서·호남 선비들의 면암에 대한 추앙이 매우 성대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고창의 선비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고창의 선비들은 면암의 순국 뒤에도 각각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지은(智隱) 최전구 의사는 스승 면암에 대한 3년상 복을 마치고 향리 성송 추산리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 그 예를 따라 일제 침탈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총독부를 성토하다가 1910년 욕지도에 1년간 유배되고, 1917년에는 영종도에 유배되었다. (의사의 향리에 세워진 추모비에 ‘丙午에 先生과 對馬島에 幽因하였고’라고 하여 면암과 같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고 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고예진 의사는 의병 해산 뒤에 체포되어 전주 감옥에 3개월간 구금되었었고, 고제만 의사는 의병활동을 계속하다가 1909년 왜 헌병대에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그 밖에도 고창의 항일의사들은 때로는 정미의병(1907)에 참여하기도 하고 광복단 또는 독립의군부 활동을 이어갔으며, 고석진, 고예진, 고제만, 고순진 등 4인은 1919년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서명하였고, 또한 고석진, 고예진 두 의사는 3·1 독립선언식에 유림대표로 참가하였음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창의 의사들은 몰년까지 항일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 
| | ⓒ (주)고창신문 | |
10. 남은 이야기 –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면암과 고창의 의사들이 일제에 맞서 항거하는 불굴의 절의와 기개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동시에 침략자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으론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결국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 당시의 우리 사가(史家)는 다음과 같이 평론 한 바 있었다.
“만일 태상황(고종황제:필자주)이 이 10년간의 틈을 타서 섭자리에 누워 쓸개를 맛보며 복수일념을 잊지 않고, 신중하게 스스로(나라를) 다스렸다면 곧 일본정부가 장차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관직을 팔고 벼슬을 팔며, 귀신에게 푸닥거리 굿하고 광대의 연극을 관람하는 것 말고는 한 가지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온갖 일들이 날로 어지럽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는데도, 오직 아라사 사람의 기세를 바라보며 한 가닥 생명줄로 삼았으니, 아아! 아라사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본인의 (검은)마음이 없으리오. 그러므로 한국이 망한 것은 아라사가 (일본에게) 패한 까닭이 아니고 오직 우리들 스스로가 해치고 스스로가 망쳤을 뿐이니, 오호라! 통탄스럽도다
(使太上皇 乘此十年之暇 臥薪嘗膽 兢兢自治 則日本將如之何哉 無如賣官鬻爵 禳神觀劇之外 無一所知 萬幾萬事 日就亂亡之塗 而惟欲仰俄羅斯人之鼻息 以爲一縷之命 噫 俄羅斯人 其獨無日本人之腸肚哉 故曰 韓之亡 非俄羅斯之敗之故 惟吾自伐 自亡而已 嗚呼痛哉 : 金澤榮, 前揭書, 十二)
위의 평론은 곧 청일전쟁(1894)에 승리한 일본이 한국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 노일전쟁(1904)에서 승리할 때까지의 10년 기간에, 군주인 고종황제가 자강불식(自强不息)하는 정사(政事)를 폈더라면, 을사늑약의 치욕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옛말에 국난사량상(國亂思良相)이 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이 말은 군주의 존재가 크지만, 군주를 보필하는 어진 재상이 있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다.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말기에는 아쉽게도 어진 군주는 물론 어진재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을사오적과 같이 친일의 편에 서서 일신과 가문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매국적신이 정권을 좌우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일진회(一進會) 같은 친일단체가 일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무법적인 행동을 일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이미 망할 징조가 있으니 나라를 들어 일본의 명을 들어야한다(我國 危亡已形 宜擧國 以聽命於日本云 前揭書,十)는 대자보를 서울거리에 붙이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다음 사례에서 보여주는 무명(無名)한 민초(民草)의 결기에 찬 행동은, 당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 백성들에게 불굴의 민족혼을 일깨워주었을 법하다.
“을사년 협박으로 조약하는 날에 근택(이근택 ; 당시 군부대신)이 대궐에서 돌아와 집안사람에게 협약의 일을 말하면서 ‘나는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고 하였다. 여종이 부엌에 있다가 듣고서 장도칼(작은 칼)을 쥐고 나가 외치기를 ‘이근택아! 너는 대신이 되었으니 나라의 은혜가 얼마인데, 나라가 위태로운 때 죽지도 않고 겨우 <나는 다행히 면했다>고 하느냐. 너는 참으로 개돼지와 같구나. 나는 비록 천한 몸이지만 어찌 개돼지의 종노릇을 좋아하랴. 나의 힘이 약해서 너를 마음대로 목을 베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차라리 옛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乙巳䝱約之日 根澤自大闕歸 對家人 話脅約事曰 吾幸而免死 婢在廚下聞之 提粧刀 出叫曰 李根澤 汝身爲大臣 國恩云何 而國危不能死 乃曰 吾幸而免 汝眞狗豚若 吾雖賤人 豈甘狗豚之奴乎 恨吾力弱 不能斬汝萬段 寧還舊主也 遂走歸其家 :黃炫 梅泉野錄)”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그 역사에는 어두운 시대와 밝은 시대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한말(韓末)의 시기는 일제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던 어두운 시기였다. 병오의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던 을사늑약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역사를 어둠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가(史家)는 평론에서 그것은 우리가 자초했다고 하였다. 왜 그런 것인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군자는 <잘못된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 論語) 는 말이 있다. 대체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의 역사에서 밝은 면은 애써 외면 또는 무시하고, 어두운 면은 침소봉대하듯이 부각시키어, 자기부정과 자기비하에 젖은 듯 한 논설을 펴는 경우가 있음을 본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결여되어 스스로 큰 체하는 자대자만(自大自慢)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자기비하로 패배주의를 조장하며 나아가 민족의 자존을 해치는 편향된 시각 또한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