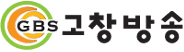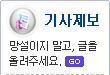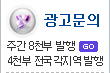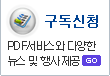|
|

|
|
조선 예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계 김장생 배향한 ‘돈암서원’
|
|
부드러운 품성으로 만인을 편안하게 하라는 꽃담의 가르침
|
|
2020년 06월 17일(수) 12:53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모내기를 끝낸 논에는 키 크느라 단잠에 빠진 어린 벼와 지킴이처럼 선 백로의 모습이 평화롭다. 탁 트인 평야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기차 소리에 오수(午睡)에 빠진 돈암서원의 공기가 술렁인다. 조용해야 할 공간에 침입한 기차 소리의 어색함은 시대적 뒤섞임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얹는다.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는 이제 시간의 갈피 속에 박제되어 숨겨지고 기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지만, 그들의 유산은 들리지 않는 묵직하고 장중한 베이스가 되어 우리의 정신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다.
계백혼이 살아 숨쉬는 솔바람길이 시작하는 곳에 조성 중인 한옥마을이 있고 그 안쪽으로 돈암서원의 영역을 알리는 홍살문과 하마비가 서 있다. 그 위치가 안정감이 없고 서원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전(移轉)과 보수작업 때문인 듯하다. 돈암서원은 원래 1634년(인조 12)에 현재의 자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연산면 하임리 숲말에 세워졌으나 1881년(고종 18)의 대홍수로 서원 건물이 물에 잠기자 지역 유림들이 서원을 높은 지대인 현재의 장소로 옮겼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강학공간인 양성당만 우선 이전하였고 1972년에 강당인 응도당을 옮겼다. 그 이후 장판각, 정회당, 산앙루 등 옛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였고 유생들의 기거 공간인 동·서재도 새로 복원하여 서원의 기본 구조를 갖추었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휘가 인재를 교육하던 경회당과 김장생이 후진을 양성하던 양성당을 중심으로 건립되었고 창건 후 1659년(효종 10)에 사액을 받았다. 1660년(현종 1)에 다시 ‘돈암’으로 사액을 받았는데 불과 1년만에 동일 액호로 사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옛터인 숲말에 있던 서원 뒷산이 돼지 형상을 이루었는데 돼지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바위가 있어 그 바위를 돈암이라고 부른 것에서 서원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자로는 숨을 둔(遯)자를 쓰는데 은둔하며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자 했던 김장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83세를 사는 동안 임진왜란, 정유재란, 계축옥사, 인조반정,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을 직접적으로 겪었으며 붕당정치의 중심에서 승진과 사퇴를 거듭하여 치열했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조용한 고향에서 은둔하여 후학을 기르며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한자로는 ‘둔암’이면서도 ‘돈암’이라고 읽는 사연이 그러하였다.
홍살문을 지나 제일 처음 만나는 누각이 산앙루이다. 산앙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2006년 세워진 누각인데 다소 황량해 보이는 넓은 평지에 산앙루만 덩그마니 놓여있다. 시간이 흐르고 서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느낌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산앙루 누각 아래 서원의 체험 활동인 유복입기, 돈암 만인소 선언, 전통놀이, 예절교육 등 ‘서원 유생 체험’과 ‘예(禮) 힐링캠프’를 알리는 배너가 서 있다. 코로나의 여파가 현재진행형이라 체험활동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하다.
산앙루를 앞세우고 서원을 감싼 돌담을 대표하듯 외삼문이 우리를 맞는다. ‘입덕문’이라는 이름의 외삼문은 솟을 대문으로 가운데만 문을 내고 양쪽은 회사벽으로 막았는데 대문을 받치고 있는 3쌍의 주춧돌이 문 안으로 들어갈수록 둥글고 매끈해지는 모양이 흥미롭다. 제일 앞에 있는 주춧돌은 사각형인데 중간에 있는 주춧돌은 팔각형이고 제일 안쪽의 주춧돌은 원형이다. 공부하고 수양할수록 모나지 않고 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니 입덕문이라는 이름은 대문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입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는 경회당, 정면 중앙에 양성당, 왼쪽으로 응도당이 배치되어 있다. 경회당은 사계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휘가 학문 연구에 힘쓰던 곳으로 지금은 서원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서원의 구조대로라면 응도당이 중앙에 있고 좌우로 동·서재가 배치되어야 하나, 돈암서원은 서원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양성당이 먼저 옮겨오고 응도당이 나중에 옮겨지다 보니 자리를 잃은 형국이다.
정작 돈암서원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건물이 응도당이다. 2008년 7월 보물 제1569호로 지정된 응도당은 현존하는 서원 건물로는 유일하게 고대 예서(禮書)에서 말하는 경·대부·사(卿·大夫·士)의 가옥인 하옥(廈屋)의 제도를 본받아 세워진 건물로, 고건축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누마루식 건물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형식이며 공포 사이의 화반이 아름답다. 맞배지붕의 풍판 밑으로 눈썹처마라고 부르는 덧지붕도 덧대어 기능적 측면의 장점 뿐 아니라 미관적 측면에서도 맞배지붕의 단조로움을 벌충하였다. 주춧돌 위 기둥엔 소금을 이용한 가공법이 사용되어 뒤틀림이 없고 썩지 않는다.
입덕문을 마주하여 좌우로 동·서재인 거경재와 정의재의 호위를 받으며 중앙에 배치된 건물이 양성당이다. 양성당 앞에 서있는 돈암서원 원정비는 1669년(현종 10)에 세운 비로 서원을 옮길 때 함께 옮겼다. 돈암서원 건립 과정과 서원의 구조, 김장생과 김집 부자의 학문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옮겨 짓기 전 서원은 사당 앞에 응도당이 있었고 그 좌우에 거경재와 정의재가 있었다는 비문의 기록으로 이축 이전 서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으며 전서체 제목은 김만기가 썼다. 김만기는 김장생의 증손자로 ‘구운몽’,‘사씨남정기’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서포 김만중의 형이며, 숙종의 부원군이다.
강학당인 양성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김장생이 생전에 후학들에게 강학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이다. 양성당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양하라는 의미로, 그가 양성당을 지으며 기록한 글은, 대둔산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계룡산이 솟아 산을 우러르고 사계천을 살피며 자연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다는 그의 소회(素懷)을 전한다.
동·서재인 거경재, 정의재는 유생들이 머무르던 공간으로 전묘후학의 전형적인 서원 구조에 따라 2000년에 지은 건물이다. 거경(居敬)이란 성리학의 수양 방법 중 하나로 흐트러짐이 없이 정신이 집중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재는 학문을 하는 유생들이 모여 경전의 의의를 자세히 강론하던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성당 서쪽 뒤편에 장판각과 정회당이 있고 동쪽 뒤편에 전사청이 배치되어 있다. 장판각은 사계전서, 신독재 전서, 사계유고 등 2천 개 가량의 목판을 보관하는 곳으로 원래 4000여 판 정도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절반가량이 소실되었다. 정회당은 사계의 부친인 김계휘가 연산으로 퇴거해 고운사라는 절에 거주하면서 편액을 단 서재로 1954년 돈암서원으로 옮겨졌다.
양성당 뒤로 꽃담을 두른 내삼문이 있다. 꽃담에는 우아한 전서체로 12자가 새겨져 있는데 ‘지부해함(地負海涵) · 박문약례(博文約禮) · 서일화풍(瑞日和風)’이라는 글자이다. ‘지부해함’은 땅이 만물을 짊어지고 바다가 모든 강을 수용하듯 넓은 아량을 함양하라는 의미이고, ‘박문약례’는 박학어문 약지이례(博學於文 約之以禮)에서 유래된 말로 학문을 익히고 예의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서일화풍’은 상서로운 날과 온화한 바람을 의미하는 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성으로 만인을 편안하게 하는 인품을 강조하고 있다. 사계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글씨로 담에 새기니 그 가르침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보통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솟을삼문인데 돈암서원은 3개의 문을 따로 분리시켜 ‘동입서출’의 예법을 확실하게 하였다.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오며 가운데 문은 제사를 지낼 때 혼령이 지나는 문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다. 장판각 쪽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내삼문 위 망와의 표정이 재미있다. 망와는 보통 벽사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망와는 토라진 듯, 귀여운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삼문을 지나면 사당인 유경사가 있는데 숭례사라는 현판을 걸고 있다. 사당은 2012년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는데 장대석 기단으로 한 단을 높게 쌓은 석축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양쪽으로 사당에 오르는 계단이 있고 양 옆에는 정료대라는 돌받침이 있다. 정료대는 불을 밝히기 위해 설치한 석조 기둥으로 제사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당 양쪽으로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서원에 배롱나무를 심는 이유는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처럼 학문에 정진하고, 매끄럽고 가식없는 나무의 줄기처럼 솔직하고 담백한 지조를 갖춘 인품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라 한다. 양성당 우측의 전사청은 제수를 준비하는 곳이다. 매년 2월 중정(中丁)과 8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서원의 위상은 사당에 배향된 인물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돈암서원에서 모시는 인물들은 모두 문묘에 배향된 대학자들로 돈암서원을 선정서원(先正書院)이라고 한다. 돈암서원은 김장생 사망 후 3년 뒤인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을 사당에 종사하였고 뒤이어 김장생의 아들 김집, 그 제자인 송준길, 송시열을 추가하여 제향하였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을 제향한 서원 중 가장 영향력있는 서원으로 조선 후기 이후 많은 인물을 배출하며 기호 지방의 대표 서원으로서 호서 사림의 실질적인 세력권을 이끌었다.
김장생(1548-1631)은 조선 시대 후기의 대학자로서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토대를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는 희원, 호는 사계이고 시호는 문원공이다. 그는 예학의 영역을 개척하여 예학을 학문으로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방 예학의 종장’으로서 구봉 송익필과 율곡 이이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83세를 사는 동안 세 번의 전쟁과 끊임없는 당파 싸움 등으로 향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늘 나라와 왕실의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선비로서의 일생을 살았다. 그의 학문은 줄곧 곁을 떠나지 않은 아들 김집에게 이어져 조선 예학을 정립하였고 김장생과 김집의 학문은 기호학파 학문의 주류를 이루며 그의 문하에서 송시열, 송준길 등 조선 유학의 거유들을 배출하였다.
이렇듯 돈암서원은 호서 지역 뿐 아니라 기호 지역 전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서원으로서 당시 실질적인 세력권자인 김장생의 영향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 연구와 호서 지역 사림의 동향을 연구하는 데 훌륭한 단서를 제공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